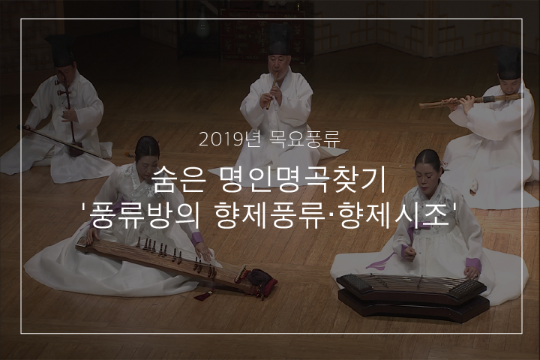-
다른 이름
풍류회(風流會), 율계(律契)
-
정의
풍류객(風流客) 또는 율객(律客)의 모임 단체 또는 조직
-
요약
풍류객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19세기 풍류방 문화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율회(律會)로 전승되었다. 풍류를 즐기는 율객들의 조직인 율회(律會)는 전국적으로 있었으며 율계(律契)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 19세기 말에 산조가 형성되면서 산조 명인들도 참여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율회(律會)가 쇠퇴하면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존속되었으나, 현재 전북의 이리와 정읍, 전남의 구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
유래
조직체 성격을 띤 근대식 개념의 율회(律會)는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한다. 조직을 갖춘 율회(律會) 외에 비조직체의 풍류회도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율회(律會)가 성행하면서 풍류방 문화의 전통 기반이 없었던 곳에서도 형성되었다.
-
내용
○ 역사 변천 과정
율회(律會)는 율(律), 즉 풍류를 즐기는 모임을 뜻한다. 그러나 풍류객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풍류 동호회 성격으로 활동했던 율회(律會)는 조선 전기에 있었던 시사(詩社), 즉 시인 묵객들이 모여 시문을 읊조리는 모임과는 성격이 달랐다.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당야한 음악을 즐기는 풍류 모임은 조선 후기에 활성화되었다. 홍대용이 중심이 되었던 ‘유춘오악회(留春塢樂會)’가 대표적이다. 19세기에는 중인 계층들의 풍류 모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서울의 중인 계층들이 인왕산 아래에 있는 송석원(松石園)에서 결성한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는 중인들의 문학 모임이었지만, 풍류도 즐겼다. 1814년에 제작된 〈수갑계첩(壽甲稧帖)〉에는 중인들이 모임에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풍류객들의 풍류 모임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풍류를 즐기던 모임을 통칭하여 풍류회 또는 율회(律會)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기에는 율계(律契)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다.
20세기에 율계(律契)에서 즐긴 음악은 조선 후기와 같은 아정한 풍류에 국한되지 않았다. 정악 계통 외에 산조나 판소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즐겼다. 흥덕 아양율계(律契)의 경우, 계원뿐 아니라 유명한 율객・기생・광대 등을 초청해 3일간이나 즐기는 대규모 율회(律會)를 갖기도 했다.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율회(律會)는 전국 각지에 있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율회(律會) 활동이 활발하였고, 전북에는 정읍의 초산율계, 흥덕의 아양율계, 이리의 이리율림계, 부안의 부풍율계, 고창의 성내3・9회 등 많은 곳에 율회(律會)가 있었다. 이후에도 전주・남원・김제 등에 율회(律會)가 있었다.
정읍 초산율계에는 전계문과, 그에게서 전수받아 발전시킨 전추산, 편재준 등과 같은 대가들이 활동했으며, 호남 지역 율회(律會)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래 아양계로 시작되었고, 훗날 초산율계 그리고 초산음률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흥덕의 아양율계는 진명선・편재준 등이 활발히 이끌었다. 아양율계가 해산되고 1961년 잔여 회원들이 육이계를 결성한 후 한동안 매월 율회(律會)를 가졌다. 고창의 성내3・9회에는 거문고 명인 신쾌동도 참여했다. 그는 흥덕의 율회(律會)에서 풍류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3・9회는 1961년 육이계로 재조직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율회(律會)를 가졌다.
이처럼 이름난 명인들은 특정 율회(律會)에만 활동하지 않고, 여러 지역를 오가면서 음악을 가르쳤다. 전북 지역의 율회(律會)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흥덕의 아양율계, 정읍의 초산풍류 등은 전북 풍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리(현 익산)에는 현 이리향제줄풍류의 모태가 된 ‘이리율림계’가 있었고, 이 율회(律會)에도 정읍 초산율계에서 활동했던 금사(琴師) 김용근과 관악기의 대가 전추산 등이 함께했다. 정읍 풍류는 아양계에서 그 후신인 초산음율회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율회(律會)로는 구례풍류가 대표적이다. 율객 김무규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그의 선친은 전추산을 비롯한 많은 율객을 초대하여 풍류를 즐겼다. 옥과 지실(地谷)에는 박석기가 재실(齋室)을 짓고 박동실을 사범으로 모셔 판소리 제자를 양성하는 가운데 한갑득을 초청해서 거문고를 배우게 하였다. 줄풍류를 가장 먼저 배웠고, 그런 다음 가곡, 산조 순서로 배우게 하였다. 화순의 오씨 마을에도 율회(律會)가 형성되었다. 재산가 오씨가 율방을 만들고 한숙구를 사범으로 모시고 풍류를 배우게 했으며, 후일에는 대금 명인 한주환도 참여했다.
호남 지역 외에 영남・충청・경기・해서 및 함경도 등지에서 풍류를 즐기던 율회(律會)는 율계(律契), ○○정악회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영남에는 진주・경주 등에 율회(律會)가 있었고, 경기에는 수원・인천 등에 있었다. 충청도에는 대전・예산 등에 있었고, 해서 지역에는 해주, 함경도에는 함흥 등에 율회(律會)가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율회(律會) 중에는 정악 계통의 음악 외에 판소리와 산조를 배우고 즐기는 경우도 있었다. 신쾌동과 같은 거문고 명인은 정악 계통의 풍류와 아울러 산조도 연주했기 때문에 이들 연주가를 통해 풍류를 익히고 산조를 즐기게 되었던 것이다. 김죽파・강태홍・김윤덕 등의 가야금산조 명인들이 산조와 줄풍류를 아우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명맥이 유지되었던 호남・영남・충청・경기 지역 중 경기와 영남의 율회(律會)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단절되었고, 그보다 앞서 해서풍류는 한국전쟁 직후 가장 먼저 단절되었다. 1970년대 이후 풍류방 문화는 급격히 쇠퇴하면서 오늘날에는 전승 지역이 이리・정읍・구례・대전 등으로 축소되었다. 이리와 구례의 율회(律會)를 통해 전승된 줄풍류는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 음악활동과 활동무대
율회(律會)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풍류객들은 청중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음악을 즐겼다. 사랑방이나 누정(樓亭)이 율방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풍류를 벌이고 즐기는 공간은 어디나 율방이 될 수가 있었다.비전문 연주가였던 율객이 많았지만, 이름난 명인들도 참여하였다. 명인들은 특정 율회(律會)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교류하였다. 그들에 의해 《영산회상》과 같은 줄풍류 외에 산조가 율회(律會)에서 향유되기도 하였다.
근대식 율회(律會)는 조선 후기 풍류 모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영산회상》・가곡・가사 등 아정한 레퍼토리를 즐겼지만, 20세기의 율회(律會)는 소위 정악 계통에 드는 음악 외에 산조나 판소리 같은 민속악 등 즐기던 레퍼토리가 다양화되었다. 물론 19세기에도 풍류방에서 정악 외에 판소리를 즐기는 사례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또한 직업의 종류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한 다양한 구성원으로 율회(律會)가 조직된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20세기에 등장한 율회(律會)는 단순히 율방의 수준을 넘어서 율계(律契)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즐겼던 레퍼토리나 율회(律會) 구성원의 성격이 조선 후기 풍류회와 다소 달랐고,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특징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전북 지역 율회(律會)의 정기 모임은 일회(日會)・삭회(朔會)・춘추계(春秋會) 등의 형태가 있었다. 일회는 매일 풍류회를 갖는 것으로 주로 지주들의 율방에서 했고, 삭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연주하는 형태였다. 춘추회는 1년 중 봄, 가을에 두 번 고창・흥덕 등지의 지주들이 열었는데, 3~4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때에는 율객・창우・기생들도 참가하였고, 수백 명이 율회(律會)의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전반기 번성했던 율회(律會)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특징 및 의의
율회(律會)는 풍류를 즐기던 조직으로 20세기에는 조선 후기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즐겼다. 조선 후기 풍류방 문화를 계승한 20세기의 율회(律會)가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지만, 조선 후기 풍류 문화를 계승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세기의 율회(律會)는 조직체의 율계(律契)이든 비조직체의 풍류회이든 연주악곡, 율객들의 신분, 풍류 공간 등 여러 면에서 조선 후기와 구별되었다. 또한 계층 간의 질서를 넘어 율회(律會) 구성원들이 풍류를 향유했고, 오늘날 전승되는 ‘향제줄풍류’의 주요한 전승 기반을 이루었다.
-
참고문헌
남상숙・임미선, 『이리향제줄풍류』, 민속원, 2006. 『향제풍류(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5. 남상숙, 「호남풍류의 전승사 및 음악적 특징: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5, 국립민속국악원, 2005. 임미선, 「20세기 풍류방 문화의 지형과 역사적 변동」, 『한국음악연구』 59, 한국국악학회, 2016. 임미선, 「전북 향제풍류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사」, 『한국음악연구』 33, 한국국악학회, 2003.
-
집필자
임미선(林美善)
-
검색태그
-
관련 동영상
더보기